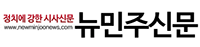우리 집은 기찻길 옆 3층 집이다. 덜커덕 덜커덕 달려가는 열차 소리 때문에 처음 이사 왔을 때에는 잠을 많이 설치기도 했다. 온 종일 2-3분 간격으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몸이라도 아픈 날이면 초저녁에 잠이 든다는 건 불가능했다. 모든 차량들이 기지국에 돌아간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에야, 몇 번이나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부칠 수가 있었다. 마치 보채는 갓난아이를 잠재우고 난 후 토막잠을 자는 젖먹이 어미의 심정이라 할까? 그러나 지금은 남들보다 비교적 예민한 내 신경세포조차 무심해져버려 잠을 설치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소음에 길 들여져 버렸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다. 생떽쥐베리의 어린왕자에게 여우가 한 말이 생각난다. 네가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나한테서 조금 떨어져서 바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너는 말을 하지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그리곤 참을성이 많아야 해. 너는 내게 있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되는거야‘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는 여우의 말을 음미해본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男子와 女子. 夫婦. 부부의 인연은 수십억 개의 실과 바늘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와 수십억 분의 확률로 꿰어져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한다. 그는 휴일인 오늘도 마루 끝에 커다란 배낭을 챙겨놓고 엎드려 등산화 끈을 조이고 있다. 새삼 은발이 희끗희끗한 남편을 바라본다. 그와 나의 곁에서 어느 사이 쏜살같이 흘러가버린 삼십 여 년의 세월들. 우리는 B시에 소재한 대학의 첫 미팅에서 만났다. 사월의 숲, 골짜기엔 아직도 봄기운을 알아채지 못한 살얼음이 보였다. 얼음 밑으로 맑은 물들은 잔인한 기다림 끝에 매달려 있는 봄을 보지 못 한 것일까? 햇살이 비치는 곳엔 숨을 고르며 분홍의 진달래가 만개하는 두근거림을 감춘채로 피어 있었다. 그는 신입생답지 않게 더블 단추가 달린 곤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후리후리하게 큰 키와 하얀 피부. 그리고 곤색 상의는 그를 충분히 돋보이게 했다. 그는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일행 중 제일 돋보인다는 것을 눈치로 알았을까? 친구들은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야 멋있다 아이가. 니 잘해 바래이” 그는 요사이 흔히 쓰는 말로 킹카였다 .짧은 스커트를 입고 스카프로 두 무릎을 가리고 앉아 있었던 내 앞에 놓인 김밥을 슬그머니 집어 가는 것도 그였고 내 몫의 칠성사이다 병을 능청스레 집어가서 병째로 마셔 댄 이도 그였다. 무례하다는 생각을 잠깐 했으나 천연스런 그의 행동에 슬그머니 마음이 풀렸는지도 모르겠다. 현란한 감정의 색채가 덧칠되지 않았던 열아홉 살. 눈을 감고 바람을 불러 모으던 청춘의 한때, 낡은 앨범 속의 그는 불꽃처럼 피어 있다. 그날의 인연 때문이었을까. 제대 후 복학생 이었던 그와 난 결혼을 했다. 전생에서 천 번을 만나야 이승에서 부부의 연을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생에 몇 번을 만난 것일까. 덜커덕 거리며 또 열차가 지나간다. 불과 수 분 전의 소리가 미처 사라지기도 전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는 소리. 잊어지고 잊혀져가는 시간의 수레바퀴는 멈추지도 돌아 설수도 없는 세월을 건너고 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무심히 돌아가는 시계바늘처럼 가끔은 들뜬 심장의 고동소리로, 한줌의 감성으로 절정 속에 나를 가두고 있었다. 내가 원했던 삶은 내 안에서 무너져 자각할 수 없는 시간들을 건너서 대책 없이 밀려오고 있었다. 00 상장회사의 중견사원이었던 그가 느닷없이 사표를 내고 어느 날 사업에 손을 대었다. 서울에서 곤지암 공장까지 그를 도와 함께 한 10여년의 세월이었다. 하루에 수면이 서너 시간이 고작이었던 그때, 새벽 별을 보고 출근 하면서 늘 종종걸음을 쳐야했던 내게 뜻하지 못했던 외환위기의 파열음과 휴유증은 보이지 않는 파편으로 박혀 버렸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섬처럼 단절되어 홀로 떠 있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고독은 그렇게 13년을 이어왔다. 신산한 마음속을 달래며 두 아들은 어렵사리 대학을 마쳤고 이제 결혼을 했다. 아득하고 막막했던 마음은 혼자만이 갖는 단절감은 아니었다. 오랜 날을 그와 나는 서로의 섬에 갇혀 살아왔다. 시퍼런 바닷물 한 가운데 떠있던 섬. 그와 함께 수많은 세월을 건너왔지만 오랜 세월을 바다 한 가운데 그와 나는 섬처럼 그렇게 떠 있었다. 한 갑자를 돌아가는 시간의 언덕배기에 기대어 그에게 말하고 싶다. 부부란 수직의 관계가 아닌 수평의 관계에서 마주 보며 서서 가는 것이라고. 이제 서로의 고단한 어깨의 짐을 내려놓자고. 그를 향해 완강했던 마음의 덧문을 조용히 열어두고 싶다. 고개 숙인 뜨겁던 한낮, 젊은 날의 시간을 다시금 움켜쥐고 숨을 고른다. 오월 푸른 하늘을 열고 굽어진 등을 뉘이고 싶다. 그리고 말하고 싶다. 말라붙은 가슴 위로 인내를 추억한다고. 상처의 힘으로 글을 쓰고 상처의 힘으로 사랑하며 다시 뜨거운 여름을 가지고 싶다고. <가정의 달 5월에 부부의 날은 둘(2)이 하나(1)란 의미로 5월 21일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 이현실 프로필 시인. 수필가 한국문인협회 회원 예술시대작가회 회원 동작문인협회 회원 문학동인 글마루회원 수필집 <꿈꾸는 몽당연필> 원본 기사 보기:breaknews전북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