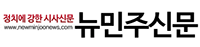|
아침부터 낮게 찌푸린 하늘은 눈을 내려 줄게라고 말하는 듯 했다. 예감처럼 함박눈의 춤사위가 시작되더니 시야가 온통 부옇다. 주먹눈이라는 어떤 시인의 표현이 참 잘 어울린다.
펑펑 쏟아진 눈들은 지상의 모습들을 감추기에 충분했다. 산에도 길에도 행인들의 어깨와 머리에도 하얗게 내려앉았다. 아파트 광장의 승용차들은 눈을 얹은 채 침묵하고 있다. 눈은 싫어하는 곳이 없다. 또 눈은 공평하여 한 곳에만 내리지 않는다. 애써 가리거나 피하지 않는다. 자신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살짝 옷깃을 부려 놓는다. 두 손을 벌려 커다란 눈송이 하나를 받아 보았다. 금방 녹아 버린다.
나뭇잎 위에 지금 막 내려앉은 눈송이를 들여다보았다. 육각의 결정체가 아름답게 빛난다. 그 작은 눈송이 안에 유년의 나와 동생이 눈싸움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누나야! 부르는 동생의 어린 음성도 들려온다. ‘아따..눈이 많이도 내렸구나.’ 식어가는 아랫목에서 뒹굴 거리고 있던 참이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덩달아 잠이 깬 남동생도 어디 어디? 하면서 목소리를 높인다. 방문을 열어젖히자 하얀 세상이 두 눈 가득 들어 왔다. 얼굴에 닿는 공기는 하얀 눈빛만큼이나 차가웠다. 따스한 이부자리의 여운이 남아 발그레한 뺨을 화들짝 놀라게 했다. 눈가루가 살풋 쌓인 툇마루에 참새들이 앙증맞은 발자국을 찍어 놓았다. 댓돌에 얌전히 놓인 아버지의 털신에도 동생과 나의 운동화에도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내복바람으로 뛰어 나가려는데 아버지는 걱정 어린 핀잔을 주셨다. “감기 들면 우짤라고? 야들아. 옷 입고 나가거라!” 아버지는 발목이 푹푹 빠지는 마당에서 눈을 치고 계셨다. 마당 한가운데로 좁은 길을 내셨다. 양옆으로 쌓여진 커다란 눈 무더기는 봄이 올 때까지 날마다 조금씩 몸집을 줄이다 필경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게다. 동생과 나는 대문을 열고 나갔다. 집 바로 앞에 넓은 밭이 있었다. 온통 눈으로 덮인 밭은 신기하게도 한층 더 넓어 보였다. 아침 햇살에 반사된 설경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경이로운 풍경에 탄성을 지르던 동생이 눈밭에 벌렁 드러누웠다. 그리고 모습이 이지러지지 않게 가까스로 일어났다. “누나야. 내 사진 잘 나왔제? 멋지제?”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눈밭에 찍어 보면서 신바람이 났다. 손가락 사진, 몸 사진 등의 사진 찍기 놀이가 싫증이 나면 눈사람을 만들었다. 양손으로 주먹 만 한 눈을 뭉쳐 눈밭에 데굴데굴 굴리면 금방 축구공만 해 지더니 크기는 자꾸 불어났다.
내가 만든 커다란 것을 몸통으로 하고 동생이 만든 작은 것을 몸통위에 올려놓으니 눈사람 모양이 만들어 졌다. 그 다음엔 눈썹과 코, 입을 만들 순서다. 눈썹길이 만큼 나뭇가지를 꺾어 붙였다. 이어서 코를 만들고 입술을 만들어 부치니 멋진 눈사람이 되었다. 동생과 나는 조심하며 마당으로 옮겼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로 분주하던 엄마는 “손 안 시럽나? 밥 묵으러 들어가자. 그 눈사람 참말로 사람하고 꼭 같구나.” 우리들이 만든 눈사람을 바라보며 웃으셨다. 옹기종기 밥상에 둘러앉아 빨갛게 언 두 손으로 밥그릇을 감쌌다. 약간 뜨거운 듯 전해지던 온기는 얼마나 행복하였던가. 밥을 먹은 후 동생과 장독대로 갔다. 준비해 간 밥 공기에 소복이 쌓인 눈을 몇 숟가락 퍼 담았다. 설탕을 섞어 비비면 빙수가 되는 것이다. 삶은 팥을 끼얹기만 한다면 요즘 우리들이 먹는 팥빙수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의 유년시절의 눈내리는 날은 재미난 일들이 참 많았다. 어른이 된 지금도 눈이 내리면 그 시절의 추억을 떠 올리게 된다. 그리고 가슴 한켠이 그리움으로 채워지면서 입가엔 빙그레 미소가 떠오르는 것이다. 우리 집 뒷산에도 눈이 탐스럽게 쌓였을까.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의 몸을 부비며 수런대던 댓잎에도 하얀 눈이 쌓였으리라. 사철 푸른 소나무들... 키 작은 소나무, 혹은 기형으로 구부러진 솔가지들 위로도 탐스런 눈꽃이 피었을라나. 제 무게 못 이겨 '딱'하는 솔가지 부러지는 소리에 부엉이의 큰 눈이 더 커졌을라나. 눈밭을 조심조심 걸었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소리 없는 발자국이 나를 따라 오고 있었다. 또박또박 찍힌 발자국 위를 사르락 사르락 눈이 얹히고 나는 앞만 보며 천천히 걷는다. 눈 내리는 날은 아득한 그리움 하나 발효를 시작한다. 머언 유년의 그리움, 혹은 젊은 날의 어떤 추억의 재현인 멋진 로맨스를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공연히 알 수 없는 어떤 일렁임이 가슴 가득 채워지는 이것! 아. 무슨 의미일까? 사르락 사르락 눈내리는 소리 이리 정겨운데.. ▽ 최영옥 프로필 경북 경주 출생 시인 수필가 ‘문학세상’ 시 등단 ‘예술세계’ 수필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예술시대작가회 회원, 시집 ‘사람아 사람아’(푸른사상, 2007) 뉴 민 주 닷 컴 사회부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최영옥시인 관련기사목록
|